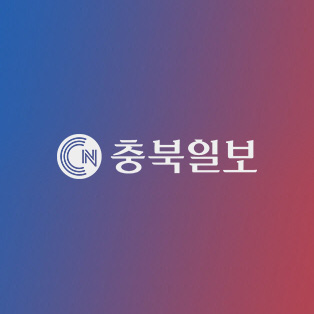설 명절 맞은 떡방앗간 풍경
하얀 김 '모락모락', 뽀얀 떡 '가지런히'
2주째 '북적북적' …"넉넉한 명절되길"
2016.02.06 03:25:00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가 골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떡방앗간.
방앗간을 누비는 주인의 손은 쉴 틈이 없었고 요란하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와 뿌연 수증기가 뒤섞여 명절 대목다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영오(54)씨가 가족과 30년을 운영해 온 방앗간은 명절을 앞두고 떡 준비로 분주했다.
방앗간 입구에 떡을 실어갈 손수레부터 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까지 바퀴 달린 것은 모두 모여들었다.

한쪽에는 '4일 김OO' '5일 박OO' 등 떡을 주문한 손님 이름과 찾아갈 날짜, 연락처가 적힌 쌀 포대가 한가득 쌓여있었다.
또 다른 한쪽에는 미리 뽑아 널어놓은 떡과 쌀을 물에 담가놓은 고무 대하가 줄지어 있었다.
손님들이 방앗간 한쪽 작은 방에 모여앉아 떡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마다 손에는 보자기나 매듭지어 놓은 꼬깃꼬깃한 검은 봉투가 어김없이 쥐어져 있었다.
시끄러운 기계음 사이로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방앗간을 찾는 손님들은 제법 나이가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60대는 젊은 사람에 속한다고 했다.
"언니는 집에 가도 없더니만 여기 와 있네."
"금요일부터 자식들 온다는 데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집에 붙어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번에 음식은 많이 해야 하는 데 오후엔 시장에 나가봐야지 손자 녀석 용돈 줄라면 저기 은행에 갔다가 들어가야지 정신없어."
할머니들의 수다는 대부분은 명절 준비로 시작돼 자식 걱정으로 끝이 났다.
끝을 모르고 주고받는 대화에 기다림이 지루할 새도 없어 보였다.

물에 불려놓은 쌀을 기계에 넣자 쌀알은 고운 가루가 돼 고무 대야에 소복이 쌓였다.
다 빻은 쌀가루는 사각형 틀에 평평히 담아 증기 찜통으로 옮겨졌다.
틀 모양대로 다 쪄진 네모난 떡 뭉치를 꺼내 가래떡 기계에 넣고 뽑으면 길쭉하게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이 만들어졌다.
눈대중으로 떡 길이를 알맞게 잡아 가위로 잘라내고 포장하면 마무리된다 .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단순해 보이는 과정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쌀 포대를 억세게 묶고 있는 노끈을 풀 때마다 손 마디마디에 생채기가 날 만큼 손에 고통이 전해진다.
게다가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물에 불린 쌀을 옮기고 찜통에 올리고 내리는 반복적인 작업은 속된 말로 '막노동'에 가깝다.
명절 2주 전부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터는 하루 18~19시간을 작업해야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래떡 외에 다른 떡이나 고추 빻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했다.
"떡국떡 나왔어요."
"내 차례구먼. 먼저 나가유."

"떡 참 잘 됐네.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어딜 갔어. 금방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제법 무거운 떡 상자를 김(여·70) 할머니는 가뿐히 들고 문밖으로 나섰다.
기다림에 지쳐 잠시 담배 한 대로 지루함을 달래보려던 할아버지는 다급한 아내의 부름을 받은 잽싸게 달려와 상자를 받아 들었다.
이번에 한 떡은 설 명절 집에 올 자식들과 떡국을 끓여먹고 조금씩 나눠 보내줄 생각이라고 했다.
김 할머니는 "자식들 손자들 없으면 뭘 해먹기나 하겠느냐"며 "이번엔 손자·손녀들도 다 온다고 하니 신이 나 지난해보다 떡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명절 대목을 맞아 모처럼 만의 성수기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명절 손님은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방앗간에서 직접 만드는 '손떡'보다 공장 등에서 대량 생산한 '기계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계떡은 소량 구매가 가능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장점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앗간을 찾는 이가 크게 줄었다.
명절이면 떡이며 음식을 넉넉히 해 이웃과 나누던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어느 정도 떡이 나오자 자리를 지키던 할머니들이 집에 갈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씨 아들(29)이 바빠졌다.
떡을 하러 먼 길을 온 노인들을 차로 집까지 데려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침에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차를 가지고 가서 태워 오기도 한다"며 "쌀이나 떡이 어르신들이 들고 이동하는 데 힘이 들어 해 이를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3시를 넘겼지만 뿌연 수증기 사이로 백색 가래떡이 허연 김을 내뱉으며 끊임없이 뽑혀 나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