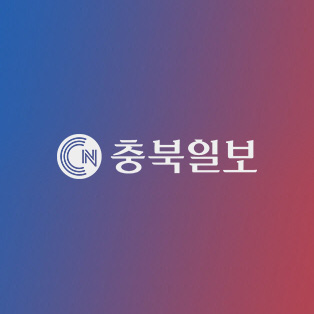임미옥
청주시 1인1책 프로그램 강사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여자가 겁 없이 편지를 보내서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나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여울지는 시냇물이었다면 미지의 사람과 펜팔교제를 하고 싶다는 호기심은 밀려오는 바닷물처럼 감정을 휩쓸어 버렸다. 어느 날 "선생님 편지 왔어요!" 집배원이 주는 편지를 유치원 꼬마들이 받아 가지고 왔을 때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 공연히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구석으로 가서 편지를 뜯었다. 첫 편지의 내용은, 본인의 편지를 반송시키지 않고 답장해준 것이 고맙다고 했다. 유려한 문체와 약간 흘림의 정자로 쓴 또박또박한 필체는 그의 인품인 양 고결하게까지 느껴졌다.
그 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탐색했다. 일 년 가까이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이 들어갔다. 연애경험이 없던 나는 상대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면서 추억을 만들어 갔다. 누군가와 소통함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별을 동경하여 무지개를 잡으려고 들판을 달리던 어릴 적 꿈들을 그를 통하여 채워갔다. 편지교환을 하다 보니 늘 보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며,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쳐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친밀감이 들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며 걸리는 것이 많았다. 그는 나이가 스물일곱 살이라 했는데, 내 나이가 스무 살이라 하면 어리다고 답장이 안 올까봐 스물네 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작은 내 키를 실제보다 십 센티나 크게 과장해서 말했다. 수많은 시인들의 시어들을 슬쩍슬쩍 인용하여 내 것인 양 글을 만든 뒤 우체통에 집어넣는 일이 허다했으니, 나는 거짓투성이였다.
천지를 붉게 태우던 단풍이 낙엽으로 변하여 땅에 구르며 온몸으로 마지막 절규를 하던 그해 가을, 드디어 그가 전역했다면서 나를 만나러 오겠노라고 했다. 순간, 가슴에서 별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그와 이별할 때가 다가옴을 직감할 수 있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현실은 엄청난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군대에 있을 동안만 그에게 활력을 주다가 전역할 즈음엔 결별의 편지를 보낼 의향이었는데 끊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밤새 고민하다 이런저런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내자 그는 크게 반발했다.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어찌 사람 인연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냐면서 막무가내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제발 오지 말라고, 와도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간절히 전했음에도 그는 왔었다. 고향의 역 광장에 있는 다방 '돌체'에서 종일이라도 기다리겠노라는 전갈이 왔었다. 그러나 만난 뒤에 나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봐 두려워 종일 고민했다. 나는 끝내 그 다방에 나가지 못했다.
낯선 곳에 왔다 야간열차를 타고 쓸쓸히 가야했던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나는 당시 몸이 축 갈 정도로 앓아누웠었다. 그를 보내고 나서야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를 첫사랑이라고 부른다. 첫사랑을 보내버린 슬픔은 혹독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보내버린 첫사랑에 대한 미련과 아픔이 뭉근히 오래 지속됐었다. 코스모스 꽃길 따라 와서 내 가슴에 머물렀던 첫사랑을 그렇게 보냈다. 영롱한 글씨체와 의미를 담았던 글귀 몇 구절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집배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꿈같이 행복했던 젊은 날은 가을이 수없이 지나가도 아픈 추억으로 남아 금처럼 반짝거린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