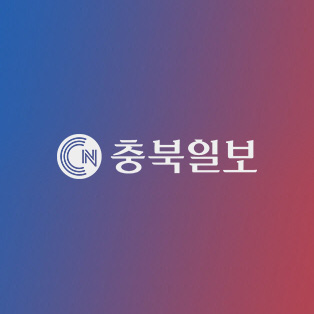임미옥
청주시1인1책 프로그램 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와있다. 자연은 자연이다. 황사가 오거나 바이러스가 오거나 자연은 상관하지 않는다. 철쭉은 아직 인데 진달래들은 바쁘다. 금시라도 꽃들을 터드리고 말 것처럼 수런댄다. 망중한忙中閑에 나비 한 마리 뾰족 내민 몽우리에 앉았는데, 실바람이 지나며 희롱한다. 햅도라지 무친 것처럼 새콤달콤한 이 봄을 어이할꼬. 이곳에 정주定住하여 저런 풍경으로 초연히 늙어가며 살고 질수는 없을까…. 그렇게 달포 이어진 우울함을 하나씩 꺼내어 산화散華시키면서 산책로를 걸었다.
쉼터에 앉아 마스크를 벗었다. 솔 향이 코를 찌른다. 흠~ 마스크가 차단했던 향을 깊숙이 들이마신다. 차단하고 사는 것이 어찌 이뿐겠는가. 빗장이 절로 느슨해진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눈과 귀를 여니, 일생 자체가 대하소설 같은 소나무들이 술술 이야기를 풀어낼 것만 같다. 꽃도 새도 사람도 잠시 목을 축이고 숨을 고르는 곳, 품이 깊은 숲의 덕성을 누린다. 그때 낮게 드리운 구름이 가는 물기를 뿌린다. 안개인지 비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안개가 내리면 어떠하며 비가 내리면 어떠하리. 노을이 지면 또 어떠하리. 풍경도 날씨도 향기도 어차피 이곳에선 하나인 것을….
작금의 나를 돌아본다. 도통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빽빽하게 시간을 쪼개며 살았는데 말이다. 동동거리며 산 그간 내 삶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무언가를 잘라내기 꺼려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일들을 끌어안고 산건 아닐까. 좀 더 하라고 속삭이는 세상에 속았던 건 아닐까. 어쩌면 내게 유익하지도 않은 스케줄들이 내 삶을 넘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달포가 넘도록 안 움직이는데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참에 단순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러려면 덜어낼 건 덜어 내야한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본다. 달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거 참 웬일인가. 내가 그러할진대 그들에게도 내가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산다는 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사람을 만나는 일은 계속될 거다. 망중한忙中閑에 절로 생각이 나도록 더욱 소중히 대해야 할지언정 사람을 덜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두문불출하는 동안 무시로 생각나고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내가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안부가 궁금하다는 건 마음이 가는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전화상이지만 요즘의 사태를, 포기하고 싶은 시국을, 신앙을 문학을 나눌 수 있는 그대들이 곁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대들로 인하여 내 삶이 윤기 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번에는 물건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이것들이야말로 덜어낼 것들이다. 옷장에는 필요이상의 옷들이 가득 걸려있다. 서재에는 다 읽지도 못하는 책들이 책장을 넘어 방바닥에 산처럼 쌓여간다. 정다운 이들이 선물한지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다. 싱크대에는 넘치는 접시들이, 신발장에는 신들이, 그러고 보니 내 삶이 온통 물건으로 차고 넘친다. 그처럼 영혼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와서 물건을 정리했다. 어디까지가 적당할까. 겉장을 열지 않은 책들을 박스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자. 시간이 지나도 풀지 않으면 그때 버리자. 사람들과 추억이 서린 물건들을 만지다가 역시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겼다. 자리교환을 한다. 오랫동안 창고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물건들이 자리를 내주고 밀려 나간다. 사람들도 이처럼 자리 교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까지 간직하는 건 우정, 사랑, 마음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 추억이 서렸다 해도 물건이 아니다. 날렵한 영혼이 된듯하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을 정복한 것처럼 통쾌하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