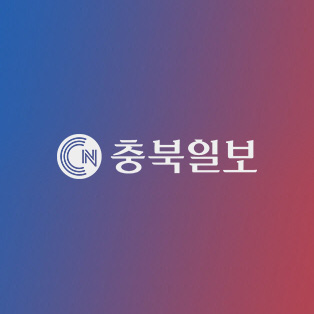[충북일보] 유종인은 일상의 사물들을 섬세한 눈길로 관찰하여 생의 슬픔을 발견해내는 시인이다. 그에게 시와 삶은 천천히 우는 슬픔의 행위다. 슬픔이 천천히 그의 몸을 적시는 동안 세상도 맨발로 그의 몸속에 스민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삶의 의미, 영혼의 실체, 원죄 의식에 대해 사색한다. 그는 종종 사물과 풍경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는다. 그의 시에 고고학적 상상력, 계보학적 추적, 고전적 취향이 나타나는 건 근원에 대한 회고적 욕망 때문이다. 옛것에 대한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그는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에 내재하는 생명에너지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편재한 슬픔들을 서정의 묵화(墨·)로 그려낸다.
때문에 그는 도시 공간, 인공 언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연에 몸을 섞어 조응한다. 그의 시에 인간의 감각기관 중 눈과 관련된 빛의 일렁임, 귀와 관련된 소리의 미세한 진동, 고요 속의 격동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적극적 포용 때문이다. 크게 보면 그의 시는 시인과 사물들 사이의 감각적 조응이고 아름다운 교향(交響)이다. 사물과 사물에 대한 시인의 마음과 몸짓이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져 섞인다. 큰 것과 작은 것,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엉킨 마음과 텅 빈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인다. 그렇게 그는 고통과 상처, 슬픔과 환멸에 대한 이미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삶을 따뜻하게 끌어안는다. 때론 광기와 열정을 통해 삶과 비판적으로 마주하기도 하고, 서(書) 화(畵)를 넘나드는 고전적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시적 산수화를 그리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돌확 속의 생」은 세 번째 시집 『수수밭 전별기』(2007)에 수록된 단아한 작품이다. 작고 아담한 절의 장독대에 놓인 돌확, 팔 할 쯤 빗물이 고인 그 돌확에 하늘과 구름이 비친다. 그런데 이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길이 평범치 않다. 빗물이 고요의 힘으로 모셔져 있고 보기 때문이다. 그 빗물이 하늘과 구름을 모셔와 제 가슴에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돌확의 물에 말벌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익사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물에 비친 구름이 섬이었으면 하고 상상한다. 왜 그럴까· 돌확의 작은 물이 말벌에게는 망망대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바다에 빠져 익사 직전일 때 바로 곁에 섬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시인은 지금 죽음 직전에 놓인 말벌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때문에 그는 도시 공간, 인공 언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연에 몸을 섞어 조응한다. 그의 시에 인간의 감각기관 중 눈과 관련된 빛의 일렁임, 귀와 관련된 소리의 미세한 진동, 고요 속의 격동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적극적 포용 때문이다. 크게 보면 그의 시는 시인과 사물들 사이의 감각적 조응이고 아름다운 교향(交響)이다. 사물과 사물에 대한 시인의 마음과 몸짓이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져 섞인다. 큰 것과 작은 것,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엉킨 마음과 텅 빈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움직인다. 그렇게 그는 고통과 상처, 슬픔과 환멸에 대한 이미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삶을 따뜻하게 끌어안는다. 때론 광기와 열정을 통해 삶과 비판적으로 마주하기도 하고, 서(書) 화(畵)를 넘나드는 고전적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시적 산수화를 그리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돌확 속의 생」은 세 번째 시집 『수수밭 전별기』(2007)에 수록된 단아한 작품이다. 작고 아담한 절의 장독대에 놓인 돌확, 팔 할 쯤 빗물이 고인 그 돌확에 하늘과 구름이 비친다. 그런데 이 평범한 풍경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길이 평범치 않다. 빗물이 고요의 힘으로 모셔져 있고 보기 때문이다. 그 빗물이 하늘과 구름을 모셔와 제 가슴에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돌확의 물에 말벌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익사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물에 비친 구름이 섬이었으면 하고 상상한다. 왜 그럴까· 돌확의 작은 물이 말벌에게는 망망대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바다에 빠져 익사 직전일 때 바로 곁에 섬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시인은 지금 죽음 직전에 놓인 말벌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
돌확 속의 생 - 유종인(1968∼ )
작은 절 영천사 뒤란 장독대 곁에
돌확 하나 모셔져 있다
지난 가을비에
돌확엔 팔 할이 빗물인데
그 빗물이 고요의 힘으로 모셔져 있다
고요한 빗물이 말간 하늘과 햇솜 같은 구름을
제 가슴에 모셔와 담고 있는데
그 돌확에 누운 구름의 물 위에
말벌 한 마리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익사 직전의 말벌이 모셔져 있다
물속의 구름이, 섬이 되었으면 싶었다
마른 떡갈나무 잎새 하나 모셔와
구름의 물에 빠진 말벌을 돌확 밖으로 모신다
돌확을 뒤엎을 수도 있었는데
돌확 속의 물은
참 오래된 수도(修道)로 고요했을 뿐인데
말벌 하나 건져진 뒤
죽음의 수위(水位)가 저 돌확 속에 모셔진 줄 몰랐다
뭐든지 모셔지는 절간 추녀 밑에서
목마름도 모르고 풍경 소리 허공에 모셔 내가는
쇠물고기 그림자를
돌확의 빗물에 한번 모셔봐야지
구름이 섬이길 바라는 이 부분에서 시인의 섬세한 마음과 미물에 대한 존중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구름은 섬일 수 없으니 시인은 얼른 떡갈나무 잎을 가져와 말벌을 구해준다. 그 다음 장면부터 시는 좀 더 깊은 사색에 뼈져든다. 참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닦아 고요해진 물, 아슬아슬했던 말벌이 살아난 후 돌확 속엔 죽음의 수위(水位)가 모셔진다. 말벌 한 마리가 떠났다고 해서 물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리는 없다. 그러나 말벌의 생사가 교차한 순간의 시간이었기에 이 비유적 수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추녀 밑에 매달린 쇠 물고기 모양의 풍경은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답고 은은한 풍경소리를 내는데, 이 장면을 시인은 물고기풍경이 자기 몸의 소리를 허공에 모셔 내간다고 표현한다. 무엇이든 모셔지던 절의 추녀 밑 공간이 보시(布施)와 자비의 배품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 시 전반에서 시인은 자신을 낮추고 사물들, 돌확과 빗물과 말벌과 떡갈나무 잎과 물고기풍경 등을 공손히 떠받들고 있다. 이런 겸양과 배려의 미덕은 유종인 시인의 평소 인품과 성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절간의 소소한 풍경으로 나를 사색에 잠기게 하는 아름다운 적요(寂寥)의 시다.
/ 함기석 시인
이 시 전반에서 시인은 자신을 낮추고 사물들, 돌확과 빗물과 말벌과 떡갈나무 잎과 물고기풍경 등을 공손히 떠받들고 있다. 이런 겸양과 배려의 미덕은 유종인 시인의 평소 인품과 성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절간의 소소한 풍경으로 나를 사색에 잠기게 하는 아름다운 적요(寂寥)의 시다.
/ 함기석 시인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