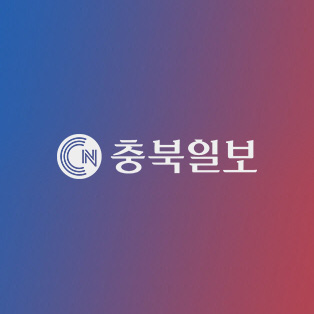임미옥
청주시1인1책 프로그램 강사
말은 난산의 고통을 겪은 어미 말이란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아 새끼가 위험에 처하게 됐단다. 이럴 때 몽골 사람들은 마두금 연주자를 불러 음악을 들려주면서 심사를 달래준단다. 그러면 음악을 들은 말이 눈물을 흘리며 맘껏 운 뒤, 유순해져서 새끼를 잘 돌본다는 거다. 말이 음악을 듣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울다니, 동물이 음악을 듣고 생각을 돌이킨다니….
어릴 적에 우리 집 어미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상황이 떠올랐다. 당시 어미 소 역시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다가오지 못하게 발길질을 해댔다. "그럼 쓰냐? 지 새끼인디 돌봐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쓰다듬고 얼러도 듣지 않았다. 급기야 아버지는 큰 오라버니와 함께 외양간에 네 다리를 묶어놓고는 강제로 수유했다. 그랬더니 결국 받아들여 포유(哺乳)하는 건 봤지만, 음악을 들려주는 건 생소하다.
마두금이 운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흐르는 처연한 소리…. 바람을 동반한 동물 울음소리인가 했더니 구슬프고 처량한 선율로 바뀐다. 여러 현악기를 모아 연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전통 악기인 해금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음성과 흡사하다는 첼로 소리 같기도 하다. 참으로 서정적이면서도 묘한 울림을 준다. 연주는 무르익어 가는데…. 말은 아직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건만 말은 미동 않는다. 말이 감동하려면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야 할까. 저 연주자가 헛수고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게 웬일, 흐느끼는 선율에 사람이 먼저 매료되고 말았다. 애잔한 음악에 내가 먼저 빠져들고 만 것이다. 이 감정은 뭘까.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일렁인다.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나를 슬픔으로 몰아넣는다. 눈을 감았다. 보인다. 말을 타고 벌판을 달리는 유목민들이…. 들린다. 초원을 훑고 가는 바람처럼, 대지를 몰아붙이는 말발굽 소리가….
눈을 떴다. 말은 여전히 말은 무표정이다. 그때, 말 주인이 말에게 다가간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말머리부터 시작해서 젖무덤까지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한다. 움직이는 손끝으로 정이 넘쳐흐른다. 소중한 이를 애무하듯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 손끝을 따라 음악도 함께 흐른다. '애썼다, 이젠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들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예술이요,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한 신전 의식이다.
그때다! 흔들리는 말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다. 말의 얼굴 근육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커다란 눈을 두어 번 끔벅였다. 그러더니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닌가! 말이 운다…. 조용하게…. 처절하고 깊게 토해내는 진한 울음이다. 말은 얼마간 그 상태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마두금도 울고, 악사도 울고 말 주인도 운다. 그리고 나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잠시 뒤, 깊은 카타르시스에서 깨어난 말은 긴 목을 좌우로 몇 차례 흔들면서 앙금을 토해내듯 큰소리를 수차례 발한다. 그러더니 몸을 공중으로 높이 날리며 제자리 뛰기를 몇 번 한다.
며칠 뒤, 몰라볼 정도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새끼와 어미가 초원을 걷고 있다. 음악과 기도,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손길이 이루어낸 쾌거다. 저들은, 동물을 대함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에게 하듯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정성을 다하면 동물도 돌이키는 것을, 하물며 사람이랴. 깊은 감동을 주는 마두금 언어, 영혼을 어루만지는 기도, 말없이 쓰다듬는 손길이면 기적을 볼 수 있으련만. 벼랑 끝에 선 사람도 잠재울 수 있으련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건조한 말만 무성했던 건 아닐까….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